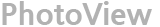약 력
강원 태백 출생
강원관광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Set, and See
At the beginning, the red tie was hung on the bough in the morning forest where I visit veryday. It was put there by somebody. A few days later, it was gone. I couldn’t let go of the tie, so I got me one and hung it on the same spot. Then came to my sight something faint but tenacious(No, it was rather ‘felt’). It was nothing but a vague feeling of anxiety or uncanniness, until I found out by chance a rope around a dead man’s neck in a windowless empty room of a deserted house in Gunsan two years later. Then I set yellow ribbons on the crape-myrtle boughs, and watched. I also set masks on the bough, when the society was chaotic with MERS. I just set, and saw.
I have been taking pictures of rice mills, barber shops, modernized stores, and empty rooms for almost twenty years, which made me recognized as a photographer of that kind. In my own way, I have been cleaving to faithful documentary. This time, I took pictures in the forest where I carried and put evidence of my anxiety, insomnia, and my subconscious one by one. Every single tree in the forest was familiar to me, since I have been visiting there for about ten years. I have been working on this in every summer for three years, only when the leaves are grown thick.
Jee Youn Kim
놓다, 보다
처음 빨간 넥타이는 늘 다니는 아침 숲길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곳에 놓았다. 며칠 후 그 넥타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그 빨간 넥타이의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구해다가 다시 걸었다. 그리고 보니 어렴풋하면서도 질긴 무언가가 보였다(아니 사실 느꼈다). 그런데 그것은 2년 후 군산 신흥동 폐가의 창문도 없는 빈방에서 한 사나이가 목에 걸었을 밧줄을 사진을 찍으러 가서 우연히 발견하기까지 그저 막연한 불안과 섬칫함이었다. 그 후 배롱나무에 노란 리본을 (붙여)놓고 보았다. 다리가 부러진 새 한 쌍을 동네 수족관(수족관에서 새도 판다)에서 빌려서 새장체로 숲에다 (가져다) 놓고 보았다. 메르스로 혼란스러운 때 마스크를 나무에 (걸어)놓고 보았다. 그저 놓고, 보았다.
나는 20년 가까이 정미소, 이발소, 근대화상회, 낡은방 등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니 아주 그런 스타일만 찍는 작가로 인식이 되었다. 나름 성실한 다큐멘터리를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진은 그동안 내 마음 속에 담아둔 잠재의식, 불면증, 불안의 증거들을 하나씩 들어다가 숲에다 놓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 십년 동안 다니던 숲은 나무 하나하나가 익숙했다. 작업은 매년 여름 숲이 무성 할 때만 3년 동안 해온 것이다. 불안전한 오브제는 숲에서 낫 설게, 혹은 더 낫 설게 보였다.
김지연
Set, and See
At the beginning, the red tie was hung on the bough in the morning forest where I visit veryday. It was put there by somebody. A few days later, it was gone. I couldn’t let go of the tie, so I got me one and hung it on the same spot. Then came to my sight something faint but tenacious(No, it was rather ‘felt’). It was nothing but a vague feeling of anxiety or uncanniness, until I found out by chance a rope around a dead man’s neck in a windowless empty room of a deserted house in Gunsan two years later. Then I set yellow ribbons on the crape-myrtle boughs, and watched. I also set masks on the bough, when the society was chaotic with MERS. I just set, and saw.
I have been taking pictures of rice mills, barber shops, modernized stores, and empty rooms for almost twenty years, which made me recognized as a photographer of that kind. In my own way, I have been cleaving to faithful documentary. This time, I took pictures in the forest where I carried and put evidence of my anxiety, insomnia, and my subconscious one by one. Every single tree in the forest was familiar to me, since I have been visiting there for about ten years. I have been working on this in every summer for three years, only when the leaves are grown thick.
Jee Youn Kim
놓고 보면 네가 사라지는 시간
완충지대
작가의 전작(前作)은 모두 글자그대로 바깥을 기록한 사진들이었다. 정미소, 이발소, 근대화 상회, 낡은 방 등등을 찍으면서 작가는 사회적 기호들, 가령 근대의 끝자락에 먼저 도착한, 곧 잊혀지고 사라질 ‘과정’에 처한 건물들, 인물들, 제스쳐들에 집중했다. 늙어가는 자신과 동일한 것들이거나 작가의 자아가 거론될 계제가 불필요한 것들을 무심하게 기록했다. 사물과 인물의 상태에 각인된 ‘시간성(temporality)’, 낡고 늙고 쓸모를 다한 대상의 “현재성(presentness)”을 그들의 일상, 장소, 풍경 안에서 포착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늙기 전에 낡아버리는, 새로움만이 의미화되는 이곳에서 낡음으로서의 늙음을 애도나 존경을 배제한 채 심지어 무심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작가의 작업에서 인상적인 것은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동어반복 같은 태도였다. 작가의 사진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첨가되지 않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바라본, 이미 과거로 지각되는 현재를 포착한다. 객관적인 사진이란 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객관적 사진 역시 주관적 심리의 확장이자 투사일 것인데, 작가는 향수, 낭만적 감상성에 적합할 소재와 이야기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느낌을 담지 않으려고 하였고, 그 만큼 사회적 사진의 상투형을 경계하고 있었다. 물론 작가의 사진은 향후 근대의 아카이브로서, 인류학적이고 민속지학적 가치를 가진 사진으로 전유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작가주의적 태도를 짐짓 경계함으로써 그녀의 사진은 기념비적이거나 영웅적인, 혹은 자의식적이거나 성찰적인 사진의 전형에서 비껴나 있다. 만약 우리를 감싼 이 많은 정서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 정서와 의미의 교조적이고 기계적인 조작이 근대를 추동시킨 반인간적인 태도였음에 주의한다면, 이미 과거에 도착한 현재에 대한 예의는 사라지는 것은 그저 사라지는 것이다를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을지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즉 사라지는 것을 마주한 사람들이 익숙하게 꺼내들 반응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인간주의에서 밀려난 주변부적 삶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중립, 배제의 의도 같은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근대를 배우지 않은 채 근대를 겪은 이들이 근대의 끝자락에서 현재성을 무시당하면서 ‘유물’처럼 박제화되고 있다면, 낡고 늙은 것들을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바깥으로 출타한 여성 작가가 찾아낸 동시대성의 주변부적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경험일 것이다. 아주 많은 정서적 에너지가 반영되었음에도, 즉 초연한 거리를 전제로 한 사진이 아님에도 객관적인 대상화를 구현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에서 우리는 짐짓 자기애와는 무관한 사회적 사진의 한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즉 이것은 찍는 나와 찍히는 너 사이에 안전한 거리가 전제되지 않은 심리적 ‘감응’의 사진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척 하는 사진이다. 있는 그대로의 대상과 세계에 대한 기록인 듯하면서도, 쉽게 간파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확장과 수렴을 기획한 이 사진의 교묘함 덕분에 작가의 사진은 기록 사진으로 분류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작가의 기록 사진은 이미 예술 사진인 것이며, 그럼에도 일어나는 오독이 작가의 특이한 태도에 기인한다면, 우리는 친밀한 사적 사진과 객관적인 기록 사진의 차이에 대해 재서술해야 할 것이다.
오래 보고 지나치게 읽기
작가의 이번 사진전 <놓다, 보다>는 전작들과 확연히 다르다. 바깥에 대한 관심은 작가 자신의 현재시간으로 바뀌었고, 일상을 구성하는 동선 중 하나가 이번 작업의 배경이다. 지난 10여 년 간 작가가 들락날락했던 집 근처 건지산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빨강 넥타이’를 출발로 한 이번 전시작들은 사진과 사진에 등장하는 오브제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제목과 사진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상념과 서술이 가미된 캡션으로 구성되었다.
배경은 한 여름이다. 여름 숲은 성장이고 우거짐이고 숨기 좋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헤매이기 좋은 시간이고 장소이다. 말하자면 여름 숲은 그 자체로 청춘, 열정, 욕망의 상징이다. 우리는 특히 여름 숲에서 길을 잃는다. 숲에서는 탈-주체화되고, 응시(gaze)에 노출되고, 나르시시즘적 반복이 불가능해진다. 불안하고 불온한 장소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밀려나고, 탈-존(ex-istence)의 상태에 있게 된다. 물론 산책에 좋은 숲은 사람들의 발길에 단단해진 길들이 있고 인가가 가깝기에 숲의 ‘이념’(Idea)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의 숲은 일상과 비일상, 친숙함과 낯섬이 교차하는 곳이고 불길함을 기다리는 작가를 ‘만족’시키는 숲이다. 동시대 예술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 중 가장 흔한 개념인바, 프로이트의 운하임리히(Unheimlich)는 친숙한 것(heimlich)에 친숙하지 않은, 낯설고 불길한 것이 이미 항상 겹쳐져 있다는 것을 통해 가까움과 멈, 친밀함과 낯섬의 이분법을 교란한다. 작가 역시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숲을 배경으로 이상한 만남과 이상한 사물의 존재 방식을 위한 무대를 설치한다.
이번 전시는 “이른 아침 숲길 나무 가지에 걸린 빨강 넥타이”가 계기이다. 양복을 입은 사내였을 그 남자가 목에서 빼내 나무에 걸어놓고 간 넥타이. 작가는 자신의 시선에 들어온 넥타이가 사라진 뒤 새 넥타이를 사다가 그곳에 걸어 놓고 보았다. 말하자면 넥타이는 지표(index)이다. 누군가가 왔고 있었고 사라졌음을 알리는 흔적이다. 이것은 사라진 존재에 대한 불길한 느낌을 내포한다. 발자국이나 굴뚝의 연기가 아니다. 한국적 근대를 압축한 생산주의의 상징이고, 직업과 역할이 곧 자기 정체성인 이들의 기호이다. 작가는 새 넥타이를 걸어놓고, 말하자면 원본과 복제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 막연한 느낌, “불안과 섬칫함”을 작가는 계속 붙들었다. 넥타이는 한 남자의 일부이고, 그 남자에게 강요된 근대의 폭력이고, 벗을 수 없었을 생존의 집요함이다. 작가는 한 사내의 흔적을, 그가 걸어놓은 생의 기호를 수신했다. 지표(index)의 불어 앵디스(indice)는 표시, 징후, 기미란 뜻을 갖고 있다. 작가에게 넥타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단서, 징후, 어떤 불길함을 담지한 암시였다.
그리고 이 넥타이의 ‘주인’을 작가는 이년 후 군산의 폐가에서 찾았다. 아니 나무에 걸려 있던 넥타이와 외딴 방의 밧줄에 걸려 있던 몸을 연결한 것은 작가였다. 떠도는 이미지, 환유적 이미지의 실재(reality)를 죽은 사내로 ‘본’ 것은 작가였다. 넥타이의 ‘주인’을 거리의, 광장의, 직장의 사내들로 지목하는 관성이나 타협은 작가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의 생산적 오독, 비틀기는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의미화를 거부하는 타자와 자신의 환유적 이미지를 연결함으로써 근대의 기호를 근대의 잔여로 재배치하려는 의도를 유지한다. 이것은 계속 떠돌겠다는 의지이고,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기이고, 그럼으로써 이 무의미한 삶에 가장 충실한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작가는 그녀 스스로 고백하듯이 오랜 불면증자이고 우울증자이다. 불면은 기호와 상징을 통치하는 의식-낮의 전제인바 잠-밤이 불가능한 자의 일상이고 상황이다. 의식이 희미한 밤과 의식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낮을 동일한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 작가에게 떠돌아다니는 기호를 상징적 좌표에 붙들어 매는 의식적 작용은 불가능하다. 그녀는 기호들이 유랑하는 장소이고, 의식적 종합이 불가능한 몸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환유적 이미지들의 저장소이고 환유적 활동의 숙주이다. 파편화된 기호들, 이미지들이 그녀를 착취하고 교란한다. 작가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일 수가 없다. 작가는 언제나 탈-존의 상태로 바깥에 노출되어 있다. 바깥의 유입을 막아줄 방어벽이 훼손된 이들에게는 자기의 일관성, 자의식적 반성이 불가능하다. 늘 흐르는, 늘 떠돎에 노출된 이들은 기호를 붙들어 매고 의미화하는 인간적 삶을 포기하는 대신에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삶을 선물받는다. 그들은 인간으로서는 희미하지만 타자를 ‘놓고 보는(느끼는)’ 데는 전문가들인 것이다. 그들은 사라지는 것, 불길한 것, 불가능한 것을 수신한다. 이것은 인간적 삶으로서는 고행이지만 타자들의 수신자에게 맡겨진 윤리이기에 한 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임무이다. 우울증자는 주지하다시피 근대의 잔여이다. 우울증자는 의식적 인간이 환영임을 현시하는 근대적 인간이다. 작가가 붉은 넥타이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다른 오브제, 이미지로 대체하면서 계속 수동적인 사로잡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증상이다. 근대를 횡단하는 근대의 잔여가 바로 예술가이기 때문이다.
대안 없이 계속 보고 느끼는 자의 ‘탁월한’ 생존법을 선매(preemption)의 전략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역시 우울증자였던 앤디 와홀은 예술가의 반사회적 공간을 일컫는 이름인바 스튜디오를 ‘공장’으로 교정했다. 이것은 자본의 바깥을 희구하는 예외적 인간들의 자의식적인 명명법에 대한 전복인데, 와홀은 이제 자본에 대적할 바깥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스튜디오란 고매한, 위악적인, 위선적인 이름을 지워야 한다. 대신에 자본주의란 문제를 늘 감각하는 몸, 소외와 착취를 개념이 아닌 몸으로 감각하는 이들이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방식은 더 철저히 자본주의를 ‘연기(perform)’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바깥을 꿈꾸면서 자본화되지만 자본주의의 바깥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 대안이 없는 사람, 늘 자본주의의 쇄도에 고통받는 사람은 먼저 자발적으로 심지어 ‘능동적’으로 자본주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의 일부가 된다.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를 더 철저히 반복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선매를 전략으로 삼는 이들의 논리이다. 단적인 예가 와홀일 뿐 대부분의 근대의 우울증자-예술가들이 그런 노선을 밟았다. 우울증자의 실천, 혹은 전략은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치유의 환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구조를 더 철저히 반복하는 것이다. 사적인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고, 우울과 비관을 전면화하는 것이고, 증상에 포획당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해에 가까운 방식은 그러나 ‘미적’ 전략이기에 단순한 수동성, 박해와 다르다. 자신의 문제를 다름 아닌 자신이 반복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 이것은 즐기는 것인데, 피학적 자신을 다루는 가학적인 의사의 자리를 자신이 꿰차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중화하는 이러한 놀이는 우울증자-예술가의 탁월함이다. 모든 우울증자가 이런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술가-우울증자는 예외적인 인간이고 이런 ‘문제화’를 통해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장면 안에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이미 정치적 행위이다.
누가 갖다 놓은 소품들, 무언극, 작은 인기척
작가는 불길하고 음산한 오브제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맥락의 오브제들을 숲에 설치했다. 배롱 나무에 매단 노란 리본이나 메르스 사태를 가리키는 마스크, 산 속 연못에 띄운 천에 적힌 “궁민을 위한 정치”라는 문구와 같은 사회적 기호들은 작가의 안식을 모르는 희미한 의식과 흐릿한 몸에 각인된 한국 근대의 지표들이다. 안식과 위로에 대한 염원은 사방팔방이 훤히 뚫린 숲에 광목천으로 커텐을 치거나, 하얀 문을 달아서 실내를 연출하는 전략을 작동시켰고, 지천에 핀 창포 꽃을 하얀 모시 헝겊으로 조금 묶어 ‘자기’에게 선물하는 자아의 이중화(doubling)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 아픈 나를 바깥의 너와 접합하려는 욕망은 나무에 목도리를 감아주거나 암을 앓고 있는 것 같은 나무(‘너’)를 광목천으로 감싸주는 행위로 가시화된다. 노무현과 계남 마을 할머니를 생각나게 만드는 찔레꽃 사진 밑 캡션의 문장은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는 자신의 ‘운명’을 할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재확증하는 작가를 엿보게 한다.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이 어쩌면 더 자신에 대해 정확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와 어머니의 관계를 암시하는 사진이 몇 개 있다. 큰 딸인 작가에게 모시 적삼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보편적인 사랑 같은 것을 기대할 것이지만 캡션의 문장은 그렇지 않다. 딸에게 너무 작은 모시적삼을 만들어주면서 “네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엄마, 도트무늬 양산을 쓰고 “봄날은 간다”란 유행가를 부르는 엄마의 화법은 무심하다. 가까워지지 않는 친밀함은 작가에게는 일상이고 운명인 것일까? 작가는 그런 거리를 사진과 캡션을 나란히 병치시키면서 전시에서도 드러냈다. 캡션의 문장은 사진을 보충하고 안정화시키지 않는다. 제목 덕분에 사진과 캡션은 겨우 한자리에 있을 뿐이다. 사진 만큼이나 작가의 문장도 독특하다. 가령 내게 <비료더미>를 찍은 사진 밑 문장, “젖은 숲에서 비료더미가 야생동물처럼 헐떡이고 있었다”는 몸으로 쓴 문장이었다. 비닐에 쌓인 비료더미와 헐떡이는 야생동물을 장대비가 이어준다. 시시하고 사소한 오브제에서 살아 움직이는 목숨, 바깥에서 사는 짐승을 보는 작가의 감각이 독특하다. 작가의 문장은 죽(어있는 것같)은 사물에 헐떡이는 숨, 들짐승의 몸을 되돌려준다. 물론 저 헐떡임이 쫒기는 짐승의 헐떡임인지 쫓는 짐승의 헐떡임인지는 모호하다. 당함과 행함의 구분이 모호한 저 헐떡임은 이해를 받기 직전, 순간으로서만 이미지화될 지표일 것이다. 놓고 보면, 의식이 사라지도록 보면, 네가 나타날 때까지 보면, 처음 보는 것 같은 이미지들이 출현한다. 죽은 상징을 생생한 이미지로 재출현시키는 것이 놓고 보는 사람의 욕망이고 윤리이다.
작가의 전시는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고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 사라지는 것들은 사라진다는 작가의 전언은 이번 전시에서 사라지는 것은 계속 나타난다, 라는 다른 문장으로 보충, 확증되었다. 사회적 문제들은 지표로서 인용되었고, 작가의 사적인 문제는 사소하고 밋밋한 장치를 통해 재연되었고, 제 자리가 아닌 곳, 어긋난 장소에 배치된 사물들은 읽기 어려운 모호성을 내포했고, 부조리극의 무대처럼 연극이 끝난 뒤에야 이미지로서의 적절성을 얻게 될 것들이었다. 의식의 환원작용에 저항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념화되지 않는 이미지들, 떠도는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그렇기에 환유적 이미지에 적합한 기법이라고들 하는 클로즈업이 가급적 사용되지 않았음에 대해서도 유념해야 한다. 오브제들은 정면을 보고 걷는 이들이 못보고 지나칠 수 있을 만 큼 멀리, 작게 배치되었다. 사소한 것들, 부분들, 환유적 이미지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인 것이다. 물론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들은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에, 밋밋하고 사소한 것들, 놓고 보아야 하는 것들이 암시하는 생의 기미의 절대성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양효실, 미학/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