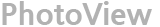약 력
강원 태백 출생
강원관광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2017.05.14 21:40
근대화상회 Modern Store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0
근대화상회( Modern Store)
현대에서 보는 근대화 상회의 의미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1945년)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격변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 오늘날 현대화로 인한 문명의 해택을 충분히 만족 할 줄도 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다져진 감수성으로 작은 일상의 풍경 속에서 겪어온 기억들을 소박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들의 기억을 추스르는 작업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실로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미 버리고 사라진 다음에 그 소중함을 들추어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대적인 것들은 고풍스러움으로 치장하려는 가벼운 인테리어 적 취향일 수도 있다.
근대화 상회의 시작은 탈농업화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고 소비가 주는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했다. 농사만 짓고 시장에 나가 직거래만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현금을 사용하며 물건을 선택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제시되고, 도시의 서민들에게 외상 거래라는 미풍양속(?)의 유혹이 주는 여유는 현대 상거래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덕목이기도 했다.
날마다 학교 앞 구멍가게를 지나면서 소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다. 네모가 반듯하게 줄이 쳐져서 나오는 공책, 지우개가 달린 알록달록한 연필, 처음 보는 12개 각기 다른 색깔의 왕자 표 크레파스, 한 알만 입에 물고 아껴 빨아먹으면 한 나절을 달콤하게 했던 눈깔사탕 등등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곁눈질만 보내야했던 시절의 이야기들.
요즘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단 몇 마디 이야기 안에서도 모스 부호처럼 판독해내며 은밀한 경험자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큼 쌉쌀한 미소를 머금는다. 그래서 나는 은밀한 경험이 아닌 100년도 체 못된 5,6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한다.
근대화 상회의 몰락
편의상“근대화 상회”를 예로 들기로 한다. 진안군에 있는 시골 한 작은 구멍가게인 “근대화 상회”는 몇 년 전에 폐업을 했다. 그곳은 시골 장터(10여 년 전 폐쇄)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3,40년 전만해도 장이 서는 날엔 새벽 동이 트자마자 손님들이 모여들어 해질녘 까지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다고 했다. 무엇을 주로 팔았는지 궁금했다.
여든이 가까운 주인장은 갑자기 목소리에 활기를 띠며 말했다.
“모든 것 다 팔았어. 없는 것이 없었제. 국수, 사탕, 비누, 석유, 다라이, 양잿물, 심지어는 돌까지 팔았어.” 돌이 무엇인지 묻자 돌확이라고 했다. 노인장이 다 열거 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시골에서 필요한 일상 용품 모두를 취급한 것이다. 일테면 지금의 슈퍼마켓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근대화 상회”가 문을 닫게 된 사연을 물었다.
“ 길이 너무 잘 뚫려버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노인장은 애먼(?) 길 탓을 한다.
소비를 담보로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대형마켓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값이 싸고, 신용이 좋고(물건의 질, 교환, 반품 등),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유 때문인가? 과연 그곳은 그런 질문에 합당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답변이 가능한 곳인가? 또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며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누가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재벌기업의 문어발 상술에 은근히 공포를 느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달려가는 행위 속에는 현대라는 범주 속에 잘 적응하는 나를 스스로 인지시키려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현대의 소비행위는 집단적인 히스테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위 현상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근대화 상회”를 이야기 할 시간은 필요하다
나는 가끔 동네 구멍가게를 기웃거린다. 그 곳에도 이미 소비의 패턴은 개성을 상실했고, 가는 곳마다 유명 회사의 몇몇 제품들이 진열대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른 물맛이 있었기에 콩나물, 두부, 만두, 막걸리 등의 맛이 달랐다. 큰 공장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더 이상 “근대화 상회”는 지친 삶터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하루에 몇 차례 다니는 텅 빈 버스 정류소에서 아직도 버스표를 팔고 있는 시골 풍경은 너무도 쓸쓸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안쓰럽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작고 고달팠지만 서민생활의 구구절절한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근대화 상회”를 이야기 할 시간은 필요하다.
김지연
근대화상회( Modern Store)
현대에서 보는 근대화 상회의 의미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1945년)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격변기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 오늘날 현대화로 인한 문명의 해택을 충분히 만족 할 줄도 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다져진 감수성으로 작은 일상의 풍경 속에서 겪어온 기억들을 소박하게 정리하려고 한다. 우리가 작고 사소한 것들의 기억을 추스르는 작업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실로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미 버리고 사라진 다음에 그 소중함을 들추어내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근대적인 것들은 고풍스러움으로 치장하려는 가벼운 인테리어 적 취향일 수도 있다.
근대화 상회의 시작은 탈농업화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고 소비가 주는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했다. 농사만 짓고 시장에 나가 직거래만 해오던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현금을 사용하며 물건을 선택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제시되고, 도시의 서민들에게 외상 거래라는 미풍양속(?)의 유혹이 주는 여유는 현대 상거래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덕목이기도 했다.
날마다 학교 앞 구멍가게를 지나면서 소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다. 네모가 반듯하게 줄이 쳐져서 나오는 공책, 지우개가 달린 알록달록한 연필, 처음 보는 12개 각기 다른 색깔의 왕자 표 크레파스, 한 알만 입에 물고 아껴 빨아먹으면 한 나절을 달콤하게 했던 눈깔사탕 등등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곁눈질만 보내야했던 시절의 이야기들.
요즘 아이들에게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사실들을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단 몇 마디 이야기 안에서도 모스 부호처럼 판독해내며 은밀한 경험자들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시큼 쌉쌀한 미소를 머금는다. 그래서 나는 은밀한 경험이 아닌 100년도 체 못된 5,6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한다.
근대화 상회의 몰락
편의상“근대화 상회”를 예로 들기로 한다. 진안군에 있는 시골 한 작은 구멍가게인 “근대화 상회”는 몇 년 전에 폐업을 했다. 그곳은 시골 장터(10여 년 전 폐쇄)의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다. 3,40년 전만해도 장이 서는 날엔 새벽 동이 트자마자 손님들이 모여들어 해질녘 까지 밥 먹을 새도 없이 바빴다고 했다. 무엇을 주로 팔았는지 궁금했다.
여든이 가까운 주인장은 갑자기 목소리에 활기를 띠며 말했다.
“모든 것 다 팔았어. 없는 것이 없었제. 국수, 사탕, 비누, 석유, 다라이, 양잿물, 심지어는 돌까지 팔았어.” 돌이 무엇인지 묻자 돌확이라고 했다. 노인장이 다 열거 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시골에서 필요한 일상 용품 모두를 취급한 것이다. 일테면 지금의 슈퍼마켓의 기능을 했던 것이다.
“근대화 상회”가 문을 닫게 된 사연을 물었다.
“ 길이 너무 잘 뚫려버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노인장은 애먼(?) 길 탓을 한다.
소비를 담보로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대형마켓을 가는 이유가 단순히 값이 싸고, 신용이 좋고(물건의 질, 교환, 반품 등),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유 때문인가? 과연 그곳은 그런 질문에 합당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답변이 가능한 곳인가? 또한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며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누가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재벌기업의 문어발 상술에 은근히 공포를 느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달려가는 행위 속에는 현대라는 범주 속에 잘 적응하는 나를 스스로 인지시키려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현대의 소비행위는 집단적인 히스테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위 현상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근대화 상회”를 이야기 할 시간은 필요하다
나는 가끔 동네 구멍가게를 기웃거린다. 그 곳에도 이미 소비의 패턴은 개성을 상실했고, 가는 곳마다 유명 회사의 몇몇 제품들이 진열대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다른 물맛이 있었기에 콩나물, 두부, 만두, 막걸리 등의 맛이 달랐다. 큰 공장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 무엇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더 이상 “근대화 상회”는 지친 삶터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다. 하루에 몇 차례 다니는 텅 빈 버스 정류소에서 아직도 버스표를 팔고 있는 시골 풍경은 너무도 쓸쓸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키기에도 안쓰럽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작고 고달팠지만 서민생활의 구구절절한 삶의 중심에 있었던 “근대화 상회”를 이야기 할 시간은 필요하다.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