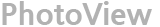약 력
강원 태백 출생
강원관광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묏동(Sepulcher)
묏동은 단순히 묘지가 아니다. 자연이며 풍경이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다시 강물이 되는, 역사 속에 순응하는 땅이며 우주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는 죽음이며 단절이며 끝이며 절망이며 허무다.
어린 시절, 혹시 이른 봄 뒷동산에 올라가서 햇볕 잘 드는 묏동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던 기억을 가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것이 그저 우리 일상의 풍경이었음을.
자연이 문명의 반어적 의미로 쓰여 진다면 문명은 자연의 반어적 의미가 될 것이다. 때로 문명이 얼마나 우리를 틀에 가두고 옹색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문명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던 암울한 묘지가 어느 날 별로 슬플 것도 없는 그저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자연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자유였다. 죽음에 대한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기, 암울한 미래에 대한 여유, 삶은 때로는 정체되기도 소통하기도 한 강물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다보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묏동은 반만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형체다. 형체는 현실이며 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묏동은 친절한 형식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반만 알고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하에 있으니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둥근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 형체를 읽고 만다. 이것이 순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의 그런 순리를 기다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에, 또한 지나치게 영구불변하는 치장을 하려하기에 묏동은 또 다른 자연의 훼손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풍경은 어쩌면 100년 후 우리가 그리워 할 다른 자연일지고 모른다.
풍수지리를 찾아서?
땅에도 기(氣)가 있어 택하고 다스려서 명당을 쓰면 자손대대 복을 받는다는 주역에 논거한 학설이다. 나는 풍수지리를 도통 모른다. 뒤에 야트막한 산이 둘러 있고 앞이 좀 트이고 냇물이 그 앞을 굽어 흐르면 좋은 자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한긴 이런 자리가 있으면 산 자에게도 편안하지 않겠는가!
왜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려하는 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연민이나 아쉬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려는 의도는 없다. 나는 과거의 이야기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시산에 그 공간에 있다는 존재증명의 제시이다.
기억되고 싶어 하는 자는 기억하는 자의 의식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연은 이 모든 기억을 스스로 정화한다.
김지연
묏동(Sepulcher)
묏동은 단순히 묘지가 아니다. 자연이며 풍경이다. 바다가 산이 되고 산이 다시 강물이 되는, 역사 속에 순응하는 땅이며 우주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묘지는 죽음이며 단절이며 끝이며 절망이며 허무다.
어린 시절, 혹시 이른 봄 뒷동산에 올라가서 햇볕 잘 드는 묏동에서 미끄럼을 타고 놀던 기억을 가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그것이 그저 우리 일상의 풍경이었음을.
자연이 문명의 반어적 의미로 쓰여 진다면 문명은 자연의 반어적 의미가 될 것이다. 때로 문명이 얼마나 우리를 틀에 가두고 옹색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 문명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던 암울한 묘지가 어느 날 별로 슬플 것도 없는 그저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자연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자유였다. 죽음에 대한 조금은 객관적인 시선,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기, 암울한 미래에 대한 여유, 삶은 때로는 정체되기도 소통하기도 한 강물 같은 것이다라고. 그러다보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묏동은 반만 둥글다.
둥글다는 것은 형체다. 형체는 현실이며 증명이다. 그래서 우리의 묏동은 친절한 형식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반만 알고 기억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하에 있으니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 둥근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가 형체를 읽고 만다. 이것이 순리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의 그런 순리를 기다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에, 또한 지나치게 영구불변하는 치장을 하려하기에 묏동은 또 다른 자연의 훼손으로 여긴다. 그래서 이 풍경은 어쩌면 100년 후 우리가 그리워 할 다른 자연일지고 모른다.
풍수지리를 찾아서?
땅에도 기(氣)가 있어 택하고 다스려서 명당을 쓰면 자손대대 복을 받는다는 주역에 논거한 학설이다. 나는 풍수지리를 도통 모른다. 뒤에 야트막한 산이 둘러 있고 앞이 좀 트이고 냇물이 그 앞을 굽어 흐르면 좋은 자리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한긴 이런 자리가 있으면 산 자에게도 편안하지 않겠는가!
왜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려하는 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연민이나 아쉬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려는 의도는 없다. 나는 과거의 이야기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는다. 이 시산에 그 공간에 있다는 존재증명의 제시이다.
기억되고 싶어 하는 자는 기억하는 자의 의식이 깃털보다 가볍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연은 이 모든 기억을 스스로 정화한다.
김지연
TAG •
- 김지연,
- 묏동,
- Kim Jee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