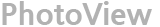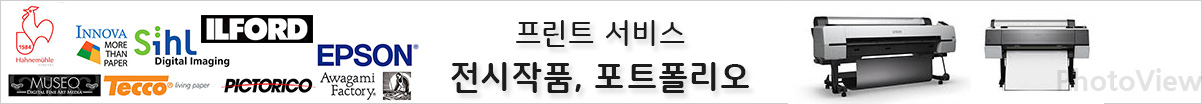나의 지극히 사적인 사진 고백서
새는 살기 위해서 땅에 부리를 처박는다. 부리로 힘껏 땅바닥을 쪼고 기어야 겨우 하루의 끼니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맹렬한 독수리라 해도 먹기 위해서는 상승을 멈추고 하강해야 한다. 날고 싶은 새는 바닥에 이르러서야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속에서 하루의 끼니를 얻는 새들은 숨도 참아가며 탁류 속을 헤집어야 겨우 하루라는 목숨을 얻는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긴 안도의 숨을 쉬겠지.
그 언젠가 나는 망했다. 정확히 망할 뻔했다. 망할 뻔한 일이 비단 그때뿐이겠나만 그때는 심하게 망가졌다. 이전에 망할 뻔했을 때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망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망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나로 인해 진 세상의 빚은 다 갚고 싶었다. 그래서 딱 빚만 갚고 돈만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둬야지 하고, 빚 갚는 일을 홀로 시작했다.
혼자 뛰다 보니 여럿이 일 할 때보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오히려 시간이 남았다. 빚을 다 갚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겠다는 각오도 했다. 먼 훗날의 그 일을 준비하고자 시작한 일이 사진공부였다. 그때 왜 사진을 하겠다는 각오를 했는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저 사진이 무엇인가를 창작하는데 만만해 보였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다.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그 언젠가보다 훨씬 오래된 옛날, 아버지가 망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린 나는 많은 불편과 고통을 덤으로 껴안게 되었다. 그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발견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새 한 마리가 나에게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에게 새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끝없는 도전의 상징이었다. 한 마리 새와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며, 사랑하고, 울고, 또 웃으며 즐겁게 푸른 하늘을 날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나는 어두운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날기도 했다. 홀로 어마어마한 빚 덩어리를 무너뜨리며 사진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새는 너무 먼 하늘을 날았고, 나는 하늘을 더 이상 날지 않았다. 사진을 찍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는 순간에도 그는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내 사진 속에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걸 내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진을 찍었다. 아니 새가 내 사진 속에 찍혀 있었다. 과거의 사진을 지금에서야 들여다보며 골라내기에도 숨이 가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카메라 파인더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발터 벤야민이 사진에 대해 말한 시지각적 무의식이 바로 새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나도 알아채기 시작했다.
지금 나에게 있어 사진은 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요, 탐구에 대한 도전이다. 현실에 대한 도피이고, 실재에 대한 끝없는 수렴이다. 내 몸 밖에서 그가 울면 내 의식 안에서 새는 노래하듯이 울부짖는다. 새는 나의 본질이자, 근원이고,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또 다른 나이다.
개인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처음 개인전을 하는 나는 알지 못한다. 지극히 사적인 나의 얘기를 하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고, 어느 누구에게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은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전시가 될 터이다.
새는 혼자 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하늘을 나는 새는 없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순간 새는 땅에 떨어진다. 죽는다.
날고 싶은 새는 땅에서 죽는다.
내 삶이 그러하다.
나의 지극히 사적인 사진 고백서
새는 살기 위해서 땅에 부리를 처박는다. 부리로 힘껏 땅바닥을 쪼고 기어야 겨우 하루의 끼니를 얻을 수 있다. 아무리 맹렬한 독수리라 해도 먹기 위해서는 상승을 멈추고 하강해야 한다. 날고 싶은 새는 바닥에 이르러서야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속에서 하루의 끼니를 얻는 새들은 숨도 참아가며 탁류 속을 헤집어야 겨우 하루라는 목숨을 얻는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긴 안도의 숨을 쉬겠지.
그 언젠가 나는 망했다. 정확히 망할 뻔했다. 망할 뻔한 일이 비단 그때뿐이겠나만 그때는 심하게 망가졌다. 이전에 망할 뻔했을 때는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망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망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나로 인해 진 세상의 빚은 다 갚고 싶었다. 그래서 딱 빚만 갚고 돈만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둬야지 하고, 빚 갚는 일을 홀로 시작했다.
혼자 뛰다 보니 여럿이 일 할 때보다 몸도 마음도 가볍고 오히려 시간이 남았다. 빚을 다 갚고 나면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겠다는 각오도 했다. 먼 훗날의 그 일을 준비하고자 시작한 일이 사진공부였다. 그때 왜 사진을 하겠다는 각오를 했는지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저 사진이 무엇인가를 창작하는데 만만해 보였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싶다. 참으로 어이없는 생각이었지만 말이다.
그 언젠가보다 훨씬 오래된 옛날, 아버지가 망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린 나는 많은 불편과 고통을 덤으로 껴안게 되었다. 그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발견한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새 한 마리가 나에게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나에게 새는 자유에 대한 열망과 끝없는 도전의 상징이었다. 한 마리 새와 함께 밥을 먹고, 공부하며, 사랑하고, 울고, 또 웃으며 즐겁게 푸른 하늘을 날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나는 어두운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하고, 죽음의 계곡을 날기도 했다. 홀로 어마어마한 빚 덩어리를 무너뜨리며 사진 공부를 하는 순간에도 새는 너무 먼 하늘을 날았고, 나는 하늘을 더 이상 날지 않았다. 사진을 찍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는 순간에도 그는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늘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는 내 사진 속에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걸 내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새 사진을 찍었다. 아니 새가 내 사진 속에 찍혀 있었다. 과거의 사진을 지금에서야 들여다보며 골라내기에도 숨이 가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카메라 파인더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발터 벤야민이 사진에 대해 말한 시지각적 무의식이 바로 새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나도 알아채기 시작했다.
지금 나에게 있어 사진은 새다. 자유에 대한 열망이요, 탐구에 대한 도전이다. 현실에 대한 도피이고, 실재에 대한 끝없는 수렴이다. 내 몸 밖에서 그가 울면 내 의식 안에서 새는 노래하듯이 울부짖는다. 새는 나의 본질이자, 근원이고, 내 안에서 소리 지르는 또 다른 나이다.
개인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처음 개인전을 하는 나는 알지 못한다. 지극히 사적인 나의 얘기를 하고 싶다. 어느 누구에게는 꼭 보여주고 싶고, 어느 누구에게는 죽어도 보여주기 싫은 내 이야기를 풀어놓는 전시가 될 터이다.
새는 혼자 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하늘을 나는 새는 없다.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순간 새는 땅에 떨어진다. 죽는다.
날고 싶은 새는 땅에서 죽는다.
내 삶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