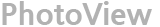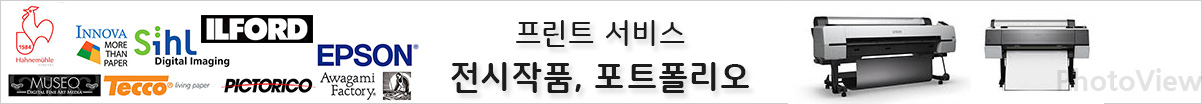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거기, 시간의 진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혹은 흐르고 있는 시간을 현상(現像)하고 회복하고 싶은 욕망은 사진을 하는 이에게 공통인 것 같다. 대개 카메라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저절로 닿는 곳이 풍경사진인 것도 세계의 진실에 닿고 싶은 순연한 열망 때문일 것이다. 세계와 나를 매개하는 미디어로 사진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상과 지각구조를 재편하는 특별한 경험의 차원이다. 모든 사진이 그러하겠지만 풍경사진이 처음엔 쉽고, 찍을수록 어려워 빠져나오기 힘든 것도 본다는 것의 층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점 시각의 용적률은 넓어지고 대상(풍경)과의 교감이 다채로워지기에,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들이 요구되는 것이 풍경사진이다.
빗금-빛 금의 시간들 - 이윤기의 지속되는 풍경사진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거기, 시간의 진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 아닐까.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혹은 흐르고 있는 시간을 현상(現像)하고 회복하고 싶은 욕망은 사진을 하는 이에게 공통인 것 같다. 대개 카메라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저절로 닿는 곳이 풍경사진인 것도 세계의 진실에 닿고 싶은 순연한 열망 때문일 것이다. 세계와 나를 매개하는 미디어로 사진이 들어온다는 것은, 일상과 지각구조를 재편하는 특별한 경험의 차원이다. 모든 사진이 그러하겠지만 풍경사진이 처음엔 쉽고, 찍을수록 어려워 빠져나오기 힘든 것도 본다는 것의 층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점 시각의 용적률은 넓어지고 대상(풍경)과의 교감이 다채로워지기에,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는 것처럼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들이 요구되는 것이 풍경사진이다.
영어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e)’에 비해 우리의 ‘풍경(風景)’은 부드럽고 섬세한 울림이 있다. 뉘앙스의 차이겠지만, 랜드스케이프가 단순히 ‘땅의 모습’을 프레이밍한 것이라면, ‘풍경’이라는 말은 ‘풍경 속의 나, 풍경 같은 나, 풍경을 찾는 나…’처럼 세계와 나를 잇는 비밀스러운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풍경(風景)’이라는 단어 속에서 바람이 만들어낸 경관, 바람과 햇볕, 그리고 그림자의 경관이라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람과 햇볕과 그림자의 표상이 풍경인 것.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사진 속으로 쉬이 들어오기 어려운 피사체가 ‘바람’이 아니던가. 풍경사진이 하나의 장르이지만 사진하는 이에게 끝없는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그 말이 함의한 다층적인 세계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흔적으로만 기입되고, 우리가 풍경사진에서 사유하는 것은 어쩌면 바람의 ‘흔적’일지 모른다. 눈에 익숙한 사진-세계가 불연 듯 낯설어지면서 특별한 비의((秘意)로 스며들거나 일순 삶의 궤도가 끊어지는 경험을 풍경사진을 찍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 쯤 해봤으리라.
이윤기의 사진세계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풍경으로 일관한다. 처음에는 도시의 단층들을 선명하게 찍었다면 점점 흔들리고 부셔지는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 사진 속에 공동(空洞)이 생기고 단절과 파편의 시간이 새겨지기도 한다. 햇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선명하거나 ‘빗금 그어진 빛’들이 포착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사진은 강한 빛과 짙은 그림자의 충돌에 의해 반짝하고 탄생한 선분들도 보인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작대교에서 창경궁과 천안문과 청송 가는 길들이 환하게 부셔져 내린다. 무엇이 이렇게 마술처럼 빛나는 빗금을 만들었을까. 물리적으로는 ‘십 분의 일초’라는 셔터스피드이지만 바람이 작가 속으로 들어와 부딪힌 어떤 시간의 흔적이 아닐지, 작가도 몰랐을 하지만 오래 지속된 시간들의 선분이 발현된 것이다. 삶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상처 입으며 살아온 시간들이 모래알처럼 맺히기도 하고, 시간과 삶을 한 덩어리로 성찰하는 시선이 흐르고 있기도 하다.
작가가 붙잡고 싶은 십 분의 일초는 그가 사진에서 되찾고 싶었던 시간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근거인 풍경-세계 속으로 들어가, 살아왔고 살아가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겹쳐 운동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특이한 것은 무엇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풍경이지만 시간의 눈들이 분명하게 포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 순간 세계가 선사하는 빛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작가의 눈빛도 반짝인다. 자유롭고 귀한 몸짓이다. 작가는 아마도 작가 속으로 들어온 바람과 더불어 ‘바깥’의 바람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바깥(피사체)이 사진가의 내적원리가 될 수 있음을 이윤기의 빗금 그어진 풍경사진을 보며 생각한다.
최연하(독립큐레이터, 사진평론가)